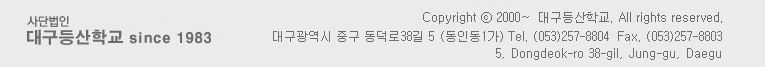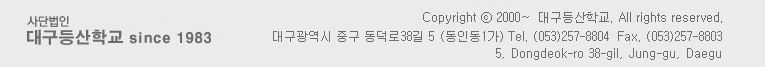|
|
글을 읽다가 가슴이 찌러러 합니다
올해나이 쉰하나. 많지도 않은 나이지만
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저도 조금 굴곡이 있었지요...ㅎㅎ
이제 혼자서라도 휭하니 떠나볼려고 시작은 하였는데.
솔직이 초야를 치르고 나서 걱정이 앞섭니다..
22년만에 처음으로 맨 배낭. 떨어지지않는 발걸음, 숨도쉬기 어려운 숨가쁨 등등
저보다 더 많으신 형님들도 잘들하시는 산행을, 최고의 저질체력으로 등록됐습니다.
저때문에 혹여 문제라도 생길까 걱정이 앞섭니다 쩝쩝.(죄송합니다)
자우지간 이제 시작됐는데 저질체력 이라도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.. 대등 87 파이팅!!!!
>
>너무나도 멋있는 후기입니다.
>
>정호승 시인의 수선화도 잘 읽고 갑니다.
>
>>초야(初夜).
>>그건 참으로 특별한 경험이었다.
>>어느 시절은 매 주말 찾기도 하였고, 또 좀 게으른 때에도 한 달에 한번정도는 찾았다.
>>그러나 함께 잠을 자본적은 없었다.
>>야간산행.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안전지향적인 삶을 살던 내게는 좀 특별한 경험이었다.
>>거의 두 시간을 집결지에서 선착순으로 달리고 오리걸음을 한 후 팔공산을 오르기 시작했다.
>>때죽나무와 소나무가 말없이 서있는 탑골을 지나 깔딱고개 230개 나무계단을 올랐다.
>>경사가 심해 올라가면 숨이 깔딱깔딱 넘어간다고 이름 붙여진 깔딱고개, 맨 몸으로 걸어 올라도 숨이 찬데 하루전날 구입한 65리터 배낭의 짐무게도 만만찮아 숨이 가쁘기 시작했다.
>>그러나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가 오늘 뿐이던가? 40대 후반에 생전처음 병원생활을 할 때도, 또 그로 인해 25년의 직장생활을 그만둘 때도 가족부양의 짐의 무게는 만만찮았다.
>>벽시계가 걸린 상상골을 지나 우측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올라갔다. 아마도 염불암 진입도로옆을 지나는 것 같았다. 이틀간 대구에 내린 비로 제법 물이 흘러가는 계곡을 마침내 건넜다.
>>계곡옆 포장도로를 가로질러 현 위치를 알리는 이정표 No 087-05옆 산길로 진입했다.
>>염불암 포장도로와 양진암 사이의 산길이었다. 마침내 야영할 지점을 찾았다.
>>꽃샘추위로 찬바람이 몹시 심하게 불고 밤이 늦은데다가 낯선 텐트였다. 어려움속에서도 모두 손을 맞춰 조별로 열심히 텐트를 치고 침낭을 펼쳤다. 큰 애가 중학교 들어갈 때 구입한 침낭이었다. 그 아이가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에 복학했으니 10년 전의 침낭이었다.
>>10년 전에 처음 부모 품을 떠나 침낭 속에서 잠을 청한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며 잠을 지샜을까?
>>밤바람이 몹시 불어 텐트위에 친 플라이가 펄럭이는 소리가 컸다. 폰에 저장한 기록을 보니 높이 663m지점이다. 내일최저기온이 2℃라고 일기예보를 들었다. 100m당 평균 -0.7℃씩 떨어지니 시내보다는 이미 4~5도가 낮을 것인데다가 찬바람이 세차게 부니 분명 이 밤은 영하의 온도가 될 것이다. 바깥 수통에 담긴 물이 내일 아침에는 얼지 않을까 생각되었다. 휴대용 나침반과 온도계가 있으나 소등중이라 보지 않았다.
>>새벽 한시에 비상이 걸렸다. 추운데다가 또 한 번 비상이 더 있을 거라 하니 별로 잠이 오지 않았다. 잠을 못 이루고 팔공산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다. 얼마 전 수태골에서 본 새끼 멧돼지 두 마리가 생각났다. 두 번이나 마주쳐서 내 폰에 사진까지 촬영되었던 그 멧돼지들은 지금쯤 어디에서 자며 얼마나 컸을까? 공부하다가 새벽 2시가 넘어야 잠을 자는 고3딸아이도 지금쯤 잠자리에 들었는지 걱정이 된다.
>>새벽4시가 되니 삐이―,삐이―하고 새소리가 울린다. 무슨 새일까. 내가팔공산에서 본 새는 기본적으로 까치, 까마귀, 멧비둘기를 제외하고 박새, 곤줄박이, 딱새, 쇠딱다구리, 오색딱따구리였다. 같은 새라도 울음소리를 다르게 내는 경우도 있어 소리만으로는 감별할 수가 없다. 새 관찰을 위해서 망원경을 꼭 하나 갖추고 싶지만 비용이 비싸 엄두가 나지 않는다.
>>같이 잠든 조원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홀로 깨어 있으니 쓸쓸한 생각이 든다. 대구출신의 시인 정호승의 ‘수선화에게’란 시가 생각났다
>>울지마라/외로우니까 사람이다/살아간다는 것은/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/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/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/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.
>>그리하여 마침내 새벽6시, 기상소리와 함께 팔공산과의 초야는 끝났다. 추위속에 나온 텐트밖에는 생강나무, 서어나무, 소나무들이 나목으로 함께 밤을 지새고 있었다. 다음날도 꽃샘추위는 여전하여 팔공산은 속내를 잘 보여주질 않았다. 추위 속에 강의가 끝나고 다시 산행이 시작되었다. 교육효과로 정돈 된 배낭이지만 텐트까지 넣어서 배낭무게와 키는 훨씬 커졌다.
>> 혹시 무릎의 반월상 연골판을 상하게 할까봐 하산 길은 조심하여 걸었다. 그리고 마침내 집결지에 도착했다. 해냈다는 성취감이 든다. 봄날은 더디게 오고 팔공산의 초야는 그렇게 지나갔다.
|
|